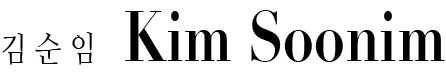2026
 soonimee 2026-01-22 14:02:56
soonimee 2026-01-22 14:02:56 출품작 : 어디서 굴러먹던 돌멩이 -을지로

‘구르놀다’ 4th
전시제목 : <머무는 몸들>
전시기간 : 2026.01.31.(토)-02.13(금) 운영시간 1-6pm, (월요일 휴무)
전시장소 : 플로우앤비트, 아이디어 회관 (서울시 중구 동호로 385-2)
오프닝 & 최라윤 오프닝 퍼포먼스 ‘침입자와 끌어안기‘ 01.31. 4pm
참여작가 : 김보라, 김성미, 김수진, 김순임, 김해심, 김현수, 이현정, 정혜령, 최라윤, 하전남, 홍지희
포스터 :김보라, 홍지희
기획 & 주최: 사공토크
주관: 플로우앤비트
후원: 아이디어회관
‘구르놀다’는 함께 걷고, 머물고, 기록하며 삶이 놓인 자리, 땅 위에서의 발디딤과 감각의 축적을 더듬어온 12명의 작가로 구성된 그룹이다. 네 번째 전시 〈머무는 몸들〉은 그간의 이동과 관찰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로, 도시 안에서 인간과 비인간, 생명과 사물, 제도와 감각이 어떻게 함께 얽혀 존재하는지를 묻는다. 이번 전시에는 그중 11명의 여성 작가가 참여해, 지난 1년간 을지로와 청계천 도심 일대를 오가며 도시에서 축적된 감각과 경험을 전시로 풀어낸다. ‘구르놀다’는 도시에서 길들여진 신체의 감각을 자연의 시간과 물질에 대입하거나, 이름과 기억, 소리와 이미지, 흩어지고 쌓이는 물질의 움직임을 통해 장소를 넘나드는 몸의 상태를 탐색해왔다. 그렇게 드러나는 ‘도시의 몸’은 특정한 공간에 고정된 생태계가 아니라, 도시와 자연, 개인의 기억과 환경이 서로 스며들며 형성되는 감각의 장으로 확장된다.
김보라는 청계천변 물 위의 집에서도 묵묵히 기둥을 세우던 바람과 머리를 짓누르던 낡은 방에서 미싱을 밟던 이름없는 이의 모진 시간을 떠올리며 <지붕 절편>을 띄운다. "한때 집이었고, 삶을 품었으나 지금은 떨어져 나온 시간의 조각" 해체된 주거 공간의 파편에 대한 인상을 바탕으로 삶을 보듬고 견뎌온 '사람의 시간'을 따라간다.
김성미의 <말할 수 없는 자>는 전시장 옆 성재묘의 도시의 긴 역사를 지켜본 늙은 회화나무 한그루가 ‘도시미관을 해친다’라는 민원과 행정 논리에 결국 잘려나가는 것을 보며 “인간 중심 도시는 비인간 존재를 어떻게 침묵시키는가?” 질문을 던진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들. 이들과 함께 이 대도시에서 말 할 수 없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깨끗해야 할 것, 병충해를 불러 모아도 안 될 것, 계절의 변화를 알려도 안되고, 건물 틈새에 뿌리를 내려도 안 될 것이며, 전깃줄에 덩쿨을 감아도, 나뭇가지가 신호등을 가려서도 안된다. 도시 개발에 앞서 미리 땅을 점령했음에도 그 존재를 앞세울 수 없다.”
김수진의 〈녹는 돌〉은 자연 앞에서 느낀 경외와 공포 속에서, 지친 신체가 바위와 동일한 물질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순간을 기록한 작업이다. 시간과 환경에 의해 변화한 신체는 바위 곁에 몸을 낮추고 밀착하며 스스로의 경계를 흐린다. “나는 바위가 되려 했고, 동시에 녹아가고 있었다.” ‘돌이 녹는다’는 표현은 소멸되고 싶은 충동과 살아 있음이 동시에 감각되는 몸의 상태를 드러낸다.
김순임의 <어디서 굴러먹던 돌멩이- 을지로>는 구르는 돌멩이의 시각으로 땅바닥에 붙어 변화하는 을지로를 바라본다. “도시의 돌멩이. 어떤 건물의 일부였다가 떨어져 나와 길 위를 구르는 이, 조경을 위해 장식했다가 누군가 발로 차 길로 굴러간 이, 100년도 안되는 인간보다 더 오래 을지로에서 터잡고 있다가, 어느 날 공사로 파여진 땅에서 올라온 이, 큰 돌이 깨지며 떨어져 나간 이, 콘크리트 벽의 일부였다가 부서진 이, 이들은 길 위의 돌멩이다. 땅바닥을 구르는 돌멩이는 땅바닥에 착 붙어 변화하는 을지로를 바라보고 있다.”
김해심은 지난 2025년 늦가을, 을지로 골목길에서 눈을 씻고 흙을 찾아 동분서주하며 주변 사물의 영향을 받았던 미세서사를 영상으로 담은 <을지로를 입었다>를 선보인다. “시작은 은행나무 때문이었다. 길거리를 노란빛으로 생생하게 바꾸던 나뭇잎은 점차 건조해져서 바람에 날리며 갈 곳을 찾는 듯이 보였다. 혹시 이곳에 흙이 있을까? 흙을 찾아 을지로의 골목길을 걸어 다녔다. 그곳은 작동하는 기계, 일하는 사람들, 담벼락의 곰팡이, 집적된 사물들이 닳은 혈관으로 연결된 거대한 집합체였다. 그곳을 따라 흐르며 나무처럼 을지로를 입었다. 걸을수록 두꺼워지는 그것을 한 켜 벗어 당신 앞에 펼친다.”
김현수는 잘려나간 식물들의 파편을 모아 전혀 다른 생명체의 형상을 만들고, 이를 사진으로 기록한 <슬픈 덩어리들을 위하여>를 전시장에 펼쳐 보인다. “을지로는 구도심이지만 여전히 빌딩이 들어서기 위해 나무들이 손쉽게 베어진다. 효율과 생산성의 논리 속에서 잘려나간 식물의 파편들은, 내게 설 자리를 잃은 존재들을 위한 상상의 장이자 애도의 대상이 되었다. 나는 이러한 식물 부스러기들에 오방색을 더해 새로운 형상을 만들고, 이를 사진으로 기록하며 사라진 나무들의 영혼을 달래는 굿을 상상한다. 서낭당의 나무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식물 오브제는 슬픔과 주술적 보호의 의미를 동시에 품은 초상으로 제시된다.”
이현정은 무한히 반복되는 영상 〈결·겹〉을 통해 풍화, 퇴적, 소멸, 생성을 그리고 그 안의 자신을 흐르듯 담아낸다. “시간은 보이지 않지만, 현상은 생기고 변하고 사라진다. 나는 그 시간이 표면에 잠깐 드러나는 순간을 붙잡고 싶다—붙잡으려 해도 지나가 버리고, 남기려 해도 남지 않는 것들. 덮였다가 드러나고 지워지는 반복 속에서, 사람과 자연의 힘이 함께 쓸고 지나간다. 나는 그 안에 있다. 그럼에도 견디고, 흐른다—겹쳐 보이되 쌓이지 않는 감각을 ‘상태’로 두고 싶었다.”
정혜령은 한문으로 쓰인 청계천의 옛 지도를 보다가 ‘이름’이란 것이 긴 설명을 압축한 하나의 키워드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작가는 함께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의 이름을 낱글자로 분리한 뒤 물에 띄워 부유하며 새로운 이름이 되었다가 해체되기를 반복하는 <몸의 땅>을 재배치한다. “동네 이름이 지형과 역사적, 사회적 사건이 축적된 기억의 압축이듯, 사람의 이름 또한 시간이 흐르며 몸이라는 ‘땅’ 위에 쌓인 경험과 관계를 통해 의미가 재구성된다. 이러한 인식은 이름을 고정된 정체성이 아닌, 살아온 시간과 타인과의 조우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형되는 과정으로 바라보게 한다. 이 작업은 물 위를 부유하며 조합과 해체를 반복하는 글자들을 통해 이름과 몸, 장소와 정체성이 관계 속에서 유동적으로 형성되는 공유된 땅임을 드러낸다.”
최라윤의 <침입자와 끌어안기_낮은 소리>는 참여형 사운드 퍼포먼스 설치 작품이다. 악기 3호는 화실 옥상에서 최근 4년간 채종한 범부채 씨앗이 들어가 있으며, 숲에서 낮게 흐르는 소리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소리이다. 악기 4호는 도심의 일상에서 흐르는 낮은 소리를 재현해 보았다고 한다. “그것들은 하나의 소리가 아니며, 자연과 도심의 웅웅거리고 틱틱거리며 부시럭대는 수많은 소리들에 대한 이미지이며, 수많은 부딛힘의 밀폐된 소리입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흐르는 낮은 소리가 되었고, 그 낮은 소리들은 전시장에서 하나하나 소환되어 꺼내어집니다. 해체되고 분해되어 숲의 것들이 도심의 것들을 만나는 상상을 해 봅니다.”
하전남은 도시 개발이 일상에 가져오는 변화에 주목한다. 수십 년의 시간을 견뎌온 나무와 삶의 터전은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순식간에 지워진다. 〈쌓이는 구멍〉은 도시 난개발이 일상에 남기는 변화를 바라보고자 한다. 오랜 시간 쌓인 삶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장면 속에서, 이 작품은 한 방울의 물이 반복되어 종이에 구멍을 내는 행위를 보여준다. 시간이 쌓여 남기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와 그 무게를 조용히 떠올리게 한다.
홍지희의 <흔들리는 몸>은 또다시 이주를 준비한다. 작가는 도시 속 흙을 움켜쥔 식물들이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흉내로 종종 물구나무를 선다. 흙을 움켜쥐고 땅에 붙박여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언제든 베어질 잠재성을 가진다. 그들은 이주민이다. “물구나무를 서면 나는 흔들린다. 원래 있던 곳에서 떠나야 한다.”
〈머무는 몸들〉은 도시를 점유하거나 설명하기보다, 그 안에 잠시 머물며 함께 흔들리는 태도에 가깝다. 이 전시는 묻는다. 우리는 무엇 위에 서 있으며, 무엇과 함께 머물고 있는가. 그리고 이 도시에서 말해지지 않은 몸들은 어떤 방식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가. 관객 역시 이 질문의 일부로서, 전시 공간 안에서 자신의 몸으로 잠시 머물기를 제안한다.